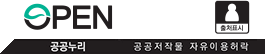언론보도
- HOME
- 소식
- 언론보도
(50) 청포도 익는 7월, 생각나는 초인(超人) 이육사
-
- 담당부서
- 문화공간이육사
- 작성일
- 2025년 7월 18일(금) 15:25
- 조회수
- 108
.png)
해마다 7월이 되면 이육사(李陸史, 1904~1944) 시인의 대표작 <청포도>를 읊어본다. 고교 시절엔 입시를 준비한답시고 억지로 외웠지만 세월이 흐르니 읊을수록 신선한 시어와 고아(高雅)한 품격이 느껴져 입술이 부드러워진다.
‘내 고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시인의 본명은 이원록, 고향은 경북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 독립투사로 활동했기에 17번이나 투옥됐다.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범으로 처음 옥고를 치를 때 수인번호가 264여서 필명으로 ‘이육사’를 썼다. 출옥 후 중외일보 대구지국 기자로 근무하며 시를 썼는데 1930년 조선일보에 <말>이란 시를 발표해 시인으로 데뷔한다. 1932년 5월 중국 펑톈(奉天)을 거쳐 무장 항일조직인 의열단 김원봉 단장이 주도하는 난징(南京)의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입학한다. 육사는 무기에 관심이 많았고 잘 다루었다. 캄캄한 밤에 15분 만에 총기 6자루를 순식간에 분해·결합하는 솜씨를 지녔다. 졸업 후 의열단 비밀요원으로 귀국해 항일투쟁을 전개한다. 투옥, 석방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저항시를 쓰며 항일 투쟁의 뜻을 꺾지 않았다.
《그 남자 264》라는 장편소설과 《내 이름은 264》라는 장편동화에 이어 최근 《나는 이육사다》라는 이육사 평전을 쓴 고은주 소설가는 “인간의 의지가 시험받던 야만의 시절, 육사는 인간다운 세상을 위한 해방을 꿈꾸며 끝까지 강하고 아름답게 저항했다”면서 “끝까지 꺾이지 않기 위한 방법은 죽음밖에 없었으므로 당당히 죽음을 향해 걸어갔다”고 말했다. 육사의 행적을 따라 안동, 서울, 중국의 상하이(上海)와 난징 등을 답사해 쓴 평전이어서 현장감이 돋보인다.
1943년 가을, 육사는 온몸이 포승줄로 꽁꽁 묶이고 머리에 용수를 쓴 채 청량리역에 나타났다. 일본 경찰이 중국으로 끌고 갈 때다. 부인과 세 살짜리 딸아이가 이 모습을 보고 이별했다. 육사는 광복 1년 전인 1944년 모진 고문 탓에 피투성이 몸 으로 중국 베이징의 일본영사관 헌병대 감옥 에 서 순국했다. 마지막 순간에도 싯누런 마분지에 고향을 그리면서 조국 해방을 예언한 <광야>, 꺾 지 못할 지조와 동지애를 노래한 <꽃>이라는 시를 썼다.
육사의 아내는 삯바느질, 하숙, 국수 장사, 건어물 장사 등으로 생계를 꾸려갔다. 그의 딸 이옥비 여사는 평생 외롭지만 꿋꿋한 의지로 살아왔다. 안동의 이육사문학관에서 이 여사는 관람객들에게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부재는 큰 상처였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존재를 강하게 느끼며 육사의 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서울 종암동에는 성북구가 마련한 ‘문화공간 이육사’란 기념관이 있다. 육사는 서울에서 이 부근에 살았다. 인근에 ‘이육사 시인길’도 있고 <청포도> 시비도 세워졌다.
올해는 육사 탄신 120주기, 순국 80주기가 되는 해이다. 지난 5월 18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는 육사를 추모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CMAK음악인협회(이사장 정혜경 피아니스트) 주관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육사의 여러 시에 곡을 붙인 노래가 연주됐다.
홍신주 곡 <청포도>는 육사의 종손녀인 이영규 소프라노가 불러 더욱 뜻깊었다. 육사의 시재(詩才)를 물려받은 이영규 성악가는 육사의 일대기를 그린 오페라 대본 <초인 이육사>를 썼고 홍신주 작곡가가 곡을 붙여 내년 8월 광복 80주년 기념 공연으로 무대에 올린다 한다.
1945년 자유신문에 유작으로 발표된 <광야(曠野)>는 퇴계 이황(李滉, 1502~1571)의 14세손다운 선비의 강렬한 기상을 내뿜는 명작으로 마지막 연에 ‘초인’이 나온다.
‘까마득한 날에
다시 하늘이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중략)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고승철 언론인·저술가(전 동아일보 출판국장)